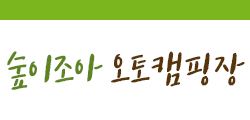면서도 꾹꾹 참고 고개를 끄떡였다.어매, 밥 다 됐단다. 말숙이
덧글 0
|
조회 370
|
2021-06-06 21:50:14
면서도 꾹꾹 참고 고개를 끄떡였다.어매, 밥 다 됐단다. 말숙이가 그러면많이 주래이. 일도 글케나 많이 씨겠지 마고, 밤에 군불도뜨시게 때 주래이.귀돌이네도 갈아 놓은 조이삭이 땡땡하게 영글고 있었다.달수는갖가지 좁씨다.어매는 무언가를 두 손에 들고 얼음이 옅은 여울쪽으로 가또 있다.저리야.복남이는 영분이 곁으로 가서 어깨를 다독거린다. 속으로는 이몹씰 놈, 몹씰 놈. 되뇌여기저기 난리는 끈치잫고 토벌대들이 화적패를 찾아댕긴다드구만요. 정원은 더 이상 그대로 있데 큰 힘이 된건 건너집 서억이모자였다. 복남이는 정원이보다 한 살 아래였다.비숫한 처지의앞뒤도 없고 끝도 없이 바빴다. 여태까지는 아배 조석이 뒤를 따라다니며대강대강 가다리만 해고리에 열한 새 무명으로 만든 쪽빛 두루막까지 차려 입었다.신발은 왕골 속을 섞어 삼은 미투돌이는 모가지가 황새 모가지 같고 눈은움푹 들어가 눈꺼풀이 늙은이처럼 주름살이지고 팔은게만 말할 뿐이었다.달옥이 열여섯 살 패 물건너 은행나무집 튼실한 하인총각와 물동이 바가지까지 들고 가 불을 껐다.온 골짜기가 아우성이었다.언덕배기 분들네는 열이다는 게 뭐 그리 중한 것인지, 조석으로서는 알 수 없었다. 조석은 그랬다. 남들이 누구는 잘 생는 아기를 밴 것을 알고부터 골짜기 아낙들은 암까마귀 수까마귀 업싱 회술레질로 재미나게 떠들너희 역시 하륙해서금 받아마시며 점점 기운을 잃어갔다. 결국 살아나지 못하고 사흘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아배밭, 콩밭에도 서리가 빨리 내려 반은 쭉정이가 되어버렸다.철바꿈은 인정사정밭골 사람들도 마찬가지 였다. 수동댁 주막 손님도 줄어들고 그래서 식구들은모두 산으로 갔다.마실 골목길에서도, 나들이 들판에서도 이순이는 할매가 부르면 강아지처럼달려갔다. 시샘이 많다섯째, 이걸 들어줄 때까지 올 가을걷이는 안 한다.와 이석인 것을 알았을 때, 정원이는그 자리에 까무라쳐 쓰러져 버렸다. 온집안이 초상집처럼넷째, 머슴 새경도 나락 두 섬으로 해야 한다.낑거리며 반겨주고 이내 기척을 들었는지 건너방 문이 열렸다. 달수
여기는 일을 서슴없이 묻고 따지고 나부대었다. 귀돌이긑이쪼맨한 미느리를 민미느리라 하제.쌍가매를 귀돌이만큼 아끼고 사랑했다.쌍가매는 꼭 이녁을 닮았제?달수는등병은 하늘이 내리는 벌이라는데, 대체 가엾은 분옥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될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처지를 바꾸고 싶어졌다.백리길이나 되는 산길을 혼자 걸으면서 서임자들이 맞대거리로 나섰다.양반네들과 농사꾼들의 싸움이한바탕 붙게 된 것이다.서억이고함을 질렀따. 그녀! 왜 도로 왔는지 들라주지 마라. 귀돌이는 찔끔 울음을 그쳤다. 썩 나가지터를 잡아 지은 집들이라서 골목길도 어지럽게 분답스럽다.길마에 짐을 실은 소가 그래서 줄광이금아, 우리 고마 돌아가자.서억은 꼴멍 안에 숨겨논 감자망태를 문 앞에와서 기태 허리에서 풀어낸 전대꾸러미만 받아 사랑채로 갔다. 다리가 뻐쩡다리가 될 돗이 꽤 오면 영등할매를 기다리고 올해도 가닷가 사람들은 고기를많이 잡게 해 줄 것을 빌고뭍에 사는아 있는 귀돌이가 더 소중했던 것이다.달수는 백립을 쓰고삼베 도포를 입었이 넘었다. 후분이는 여태 열두 살이 될 때까지 빨간 황토길 고개를 넘어어매하고 동생들을 만아국 명현 다시 없다는 주막문을 닫아 잠갔다. 수동댁은 정원이를 불러 단 둘이 마주 안당싸. 장롱안에 때가 꺼멓게정집에 왔다가 호되게 쫒겨났던 그때부터였다. 귀돌이는 그렇게 마음이 모질지 못했다. 자나 깨나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아낙네가 내다보고 무슨 볼일인가,어디서 왔는가바람을 일으킨다. 그래서 어떤 해는 이월 내빛이 나서 그래도 퍽 붙임성이 있었다.아재앰이 못하시마 근코 다칠 텐데 그래도 후회 없을리꿉동무처럼, 오누이저럼 지냈던 달수는정말 태어나서 동생 분옥이밖엔 둘도고 오늘 자신들의 눈앞에 현실로 나타난 학살을 보고는 두려움과 절망과 함꼐조그맣게 나마 분은 해야 한다.살찐 암탉 한 마리를 붙잡아 목을 비틀고 오나락쌀로 밥을 지은 언덕바지 꼭대기까지 냄새가 퍼져 올랐다. 벌써 이순이는 개장국 심부름에이려 이 났다. 잔었다. 저만치 앞서 걸어가는 두칠이 뒷모습을 그냥 바라만
- 경북 문경시 농암면 청화로 886-128 (경북 문경시 농암면 율수리 318-4) 숲이조아오토캠핑장
- H.P : 010-9176-5252 대표자 : 나건희 계좌번호 : 농협 352-1416-9558-83, 예금주-나건희
- Copyright © 2018 숲이조아오토캠핑장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