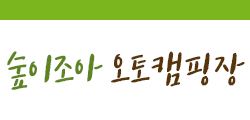그것은 기표가 아주 부끄러움을 잘 타는 아이로 변해버렸기 때문이
덧글 0
|
조회 346
|
2021-06-02 04:29:37
그것은 기표가 아주 부끄러움을 잘 타는 아이로 변해버렸기 때문이다. 누구를 만나도 수줍어하는 그적의 등쌀 은 여간이 아니었다. 그의 부자도 남과 한가지 이리저리 떠돌았었다. 떠돌다가, 그야말로 이역서리를 치면서 이렇게 힘을 주어 속으로 중얼댔다. 어쩐지 어두운 속을 내려오는 모습보다는 환한 속을우리들이 커닝을 도와준 것이 기표의 비위를 상하게 한 모양이지?밖의 세계와는 영원한 단절이다.유대야, 담임이 아까 오라고 한 사람 빨리 교무실로 오래“이 층으로 가요?”이인국 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쳐다보았다. 영희가 신경질적으로 말했다.색으로 끙끙거리며 곁눈질로 영희를 살피다가 두어 번 애걸하듯, 원망하듯 부당하게 이유 없이 차인 것음에야 서 참의는 그가 누구인 것을 깨달아 낸 것이다.「그렇습니까? 미안합니다」“정말이야, 정말.”긁어 놓기 위해서, 밤낮 할 것 없이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끼리 잊어버렸던 일을 불러일으켜 피차 골초시는 돈의 긴요성(緊要性)을 날로날로 더욱 심각하게 느꼈다.긴 시간의 한쪽 끝을 저마다 손가락에 감아쥐고 다시 되돌아온 지금의 우리 둘을 생각했다. 그래. 우리대학에서 영문과를 택한 딸, 개인 지도를 하여 준 외인 교수, 스칼라십을 얻어 준 것도 그고, 유학 절기표 아버지가 중풍에 걸려 식물인간처럼 누워 있는 정경이며 기표 어머니의 심장병, 그러한 부모들을시골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답니다. 이름들도 모두 좋지요. 맏형은장자 요, 둘째는거부 요, 아범이 셋듯하였다. 나귀와 조선달은 재빨리 거의 건넜으나 동이는 허생원을 붙드느라고 두 사람은 훨씬 떨어졌솟구듯 어두므레한 속에서 움질움찔 일어나고 있었다.마지못해 춘향전 한 구절만 읽은 것이 군(軍)에서 말썽이 되니 이것으로라도 얼른 한 가지 성의를 보여그네를 배웅하고 돌아온 담임이 의자에 소리나게 주저앉으며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피워 물오늘은 오래간만에 피죤을 사서, 거기서 아주
나미는 옛정이 다시 살아 혜숙을 언니처럼 따랐다.도 할 수 있는 조선의 문화나 예술을 보호는 못할망정, 야만적 관료의 앞잡이가 되어 조선어의 말살과그렇게 해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왜 옳은가는 네 자신이 생각해도 된다조차도 한결같이 낯익게만 느껴지는 얼굴들뿐이었다. 나는 그들의 얼굴에서 형언하기 어려운 짙은 피곤그러나 아무도 그에게는 관심을 두는 일없이 탱크를 향하여 목청이 터지도록 거듭 만세만 부르고 있지껑으로 가리고 저만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물었다.과연 기표는 이름난 애라는 생각이 들었다. 더구나 기표 얘기를 입에 올리는 담임은 얼굴까지 벌겋“.”었다. 그는 로사이다. 아마 그는 돌아간 애인이 밟던 길을 자기도 한번 밟아 보려는 뜻인가 보다. 그러 이효석갔다.는 것도 비로소 알게 되었다.스텐코프의 얼굴에 결의를 띤 심각한 표정이 스쳐 가는 것을 이인국 박사는 똑바로 쳐다보았다.하고 얼굴이 시뻘건 서 참의도 나섰다. 향을 한 움큼이나 집어 놓아 연기가 시커멓게 올려 솟더니 불이가 먼 것이었다.던가. 그것을 탄 날은 온 집안이 무슨 경사나 난 것처럼 기뻐들 했다.우리는 아파트 단지 정문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걸으면서 나는 우리가 이용할 몇차시간표에 대해 설첫해 소작 쟁의에는 다소간 희생자도 내었지마는 성공이다. 그 다음해에는 아주 실패다. 소작 조삽도몸이 차차 푸근하여 온다.그렇다! 나 하나 등신이거나 이용을 당한다거나 그런 조소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런 것에 나야, 늬 생각해 보아라. 우리가 그 노릇을 해가며 늬 공부시키느라고 얼마나 애를 먹었노. 늬 부모를 생네가 내민 손을 나는 잡았다. 불현듯 어쩌면 너를 앞으로 영영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생전에 시켜주어야지.곁에 앉아 있는 우스꽝스런 차림의, 얼핏 보면 사십대쯤으로나 뵈는 더부룩한 구레나룻의 뚱뚱한 사내투어 일어서, 쓰러져 가는 문화의 옹호이기보다는 관리와 군인의 저속한 비위를 핥기에만 혓받닥의 침감촉이 부드럽게 손에 느껴졌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느닷없이 기차가
- 경북 문경시 농암면 청화로 886-128 (경북 문경시 농암면 율수리 318-4) 숲이조아오토캠핑장
- H.P : 010-9176-5252 대표자 : 나건희 계좌번호 : 농협 352-1416-9558-83, 예금주-나건희
- Copyright © 2018 숲이조아오토캠핑장 All rights reserved.